입력 : 2017.02.28 03:04

"아이고, 여기 있었구려."
오래 헤어져 있던 정인을 만난 것처럼 책 한 권을 얼싸안고 표지를 어루만진다.
오래 헤어져 있던 정인을 만난 것처럼 책 한 권을 얼싸안고 표지를 어루만진다.
좁은 방 핑계로 어머님이 상자 속에 가두어 다락으로 쫓아낸 책들 속에서 간신히 구해낸 책이다.
'매창(梅窓·1573~1610) 전집'. 어찌어찌 부안을 갔고 발길 따라 들른 곳이 매창공원이었다.
'매창(梅窓·1573~1610) 전집'. 어찌어찌 부안을 갔고 발길 따라 들른 곳이 매창공원이었다.
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매창 시비 앞에서 홀린 듯 한참을 서성거렸다.
'이화우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/
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/
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.'
'이화우(梨花雨)' 시비 앞에서 알은 척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, 애끊는 정에 머리칼이 세고 가락지도 안 맞는다며
'이화우(梨花雨)' 시비 앞에서 알은 척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, 애끊는 정에 머리칼이 세고 가락지도 안 맞는다며
그리움을 토해내는 '임 생각' 앞에서는 "에고…. 이 일을 어쩔꼬" 혀를 차며 시비를 가만히 쓸어 보기도 했다.
그런 우리 일행을 지켜보시던 공원 관계자 한 분이 여섯 번째 개정판이라며 '매창 전집'을 선물해 주신 것이다.
가볍게 떠난 여행이라 손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섰던 터라 거의 1000쪽이나 되는 매창 전집은 종이백에 담겨
내 품 안에서 함께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렇게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만난 인연이 매창이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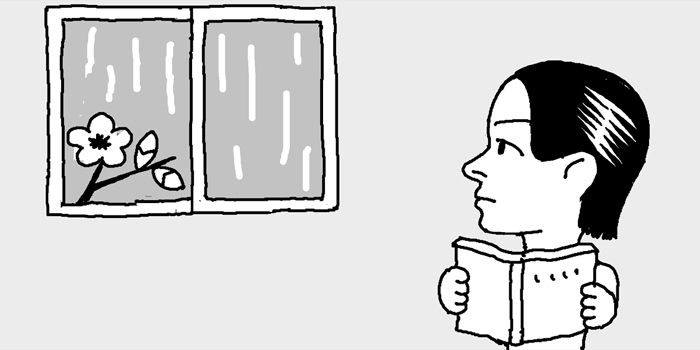
그녀의 기록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 이유가 또 있다. 자식도 제자도 없이 기생의 신분을 한탄하며 기구한 운명을 살다간
매창의 시를 살려 놓은 것이 부풍시사(扶風詩社; 부안의 시인 모임)의 촌로들이었다는 점이다.
"왕후장상의 묘비도 두 번 세우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유독 그대의 묘비만은 항상 서민 대중의 손
"미안하다, 미안해." 눅눅해진 책장을 쓸어 말리며 나는 달력을 펴든다. 일정 없는 어느 날 훌쩍 부안으로 달려가리라, 다짐하며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칸에 '매창 만나는 날'이라고 써 넣는다. 조닷
'쉬어가는 亭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- 한현우·주말뉴스부장 (0) | 2017.06.10 |
|---|---|
| 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에 특별한 숫자가? (0) | 2017.03.28 |
|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왜 여자 사진을 붙이나요? (0) | 2017.02.28 |
| 현모양처는 잊어라, '조선의 워킹맘' 신사임당 (0) | 2017.01.25 |
| '의리'란 탈을 쓴 불의 (0) | 2016.11.29 |